유자녀 가구, 무자녀보다 부동산·금융자산 1억 3,000만 원 더 많아
평균 자산 6.7억 원.. “가족 구조 따라 달라지는 재테크 전략”

학령기 자녀를 둔 40대 후반 기혼 가구의 평균 자산이 6억 7,000만 원에 이르고, 월평균 소득이 702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자녀 유무에 따라 가구의 자산과 소득 구조에서 뚜렷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무자녀 가구에 비해 자가 보유율과 부동산·금융자산 규모에서 우위를 드러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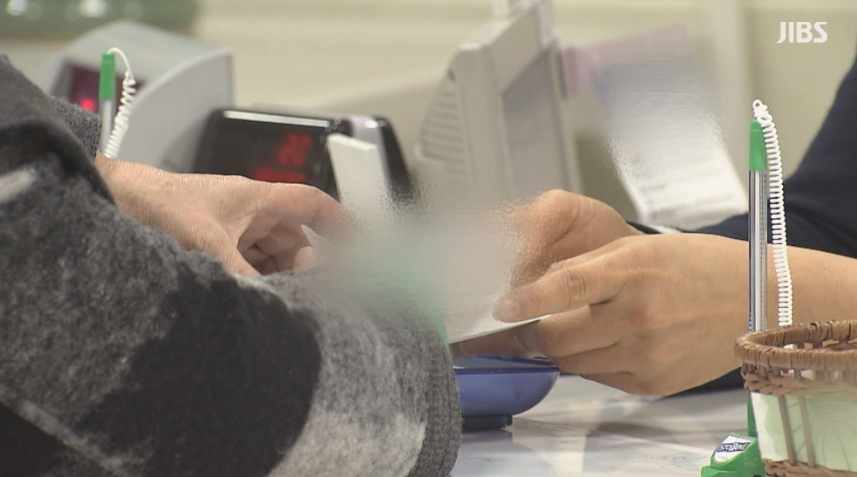
■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보고서 2025’ 주 내용은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연구소가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보고서 2025’에서 서울·수도권 및 전국 광역시 거주 20~64살 금융소비자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2024년 7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1.4% 포인트(p)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55.8%는 기혼, 40.4%는 미혼으로 분류됐습니다. 미혼 가구의 평균 연령은 35살로, 월평균 소득이 339만 원에 불과했지만, 결혼 후 신혼 3년 차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611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학령기 자녀를 둔 47살 기혼 가구는 월 소득이 702만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성인 자녀를 둔 58살 가구에서 636만 원으로 소폭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 자녀 유무에 따른 자산과 소득 구조의 차이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 간 자산 격차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에서 더욱 두드진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유자녀 가구의 평균 자산은 7억 4,009만 원으로, 무자녀 가구(6억 743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 이상 많았습니다. 유자녀 가구는 금융자산이 1억 4,772만 원, 부동산 자산이 5억 6,493만 원 규모로 집계된 반면, 무자녀 가구는 금융자산 1억 3,003만 원, 부동산 자산 4억 5,626만 원에 그쳤습니다.
또한 자가 보유율에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유자녀 가구의 자가 보유율은 76.2%로 무자녀 가구(62.7%)보다 13.5%p 높았습니다. 이는 자녀 양육을 위한 안정적 주거 마련과 미래 대비 자산 축적의 중요성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 소득 증가와 저축 감소의 상관관계
흥미로운 점은 유자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무자녀 가구보다 40만 원 정도 많았지만, 저축액은 오히려 낮다는 점입니다. 유자녀 가구의 월평균 저축액은 127만 원으로 무자녀 가구(149만 원)보다 20만 원 적었습니다. 이는 교육비와 생활비 등 자녀 양육에 따른 지출 증가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맞벌이 가구 비율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무자녀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75.2%로 유자녀 가구(65.6%)보다 10%p 높았습니다. 이는 자녀 유무가 가계 경제와 소득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하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 연령별 자산과 소득 변화.. 재태크 전략, 나이 따라 달라져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구의 자산과 자가 보유율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평균 연령 35살 미혼 가구 자산은 2억 5,000만 원, 자가 보유율은 33%에 그쳤지만 학령기 자녀를 둔 47살 기혼 가구는 자산 6억 7,000만 원, 자가 보유율 72%를 기록했습니다. 성인 자녀를 둔 58살 가구는 자산 7억 9,000만 원, 자가 보유율 80%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보고서는 “자녀 유무와 연령대에 따라 재테크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라며, “특히 자산 형성과 안정적 주거 마련에 있어 가족 구성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평균 자산 6.7억 원.. “가족 구조 따라 달라지는 재테크 전략”

학령기 자녀를 둔 40대 후반 기혼 가구의 평균 자산이 6억 7,000만 원에 이르고, 월평균 소득이 702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자녀 유무에 따라 가구의 자산과 소득 구조에서 뚜렷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무자녀 가구에 비해 자가 보유율과 부동산·금융자산 규모에서 우위를 드러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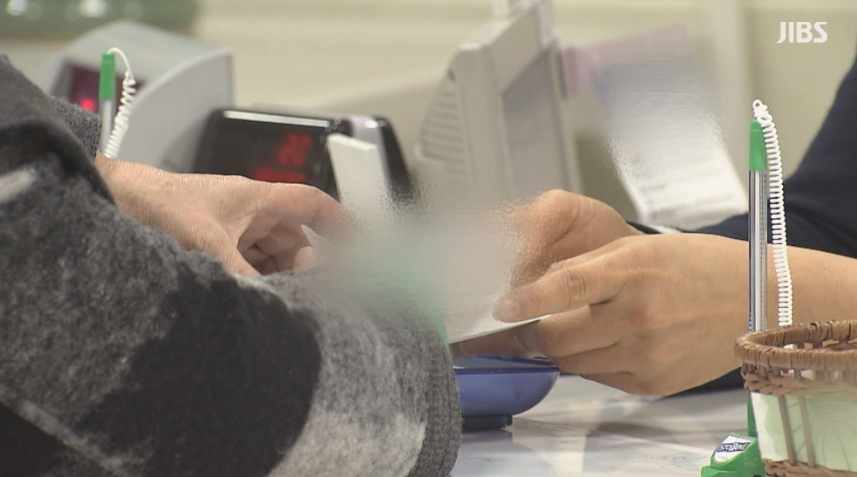
■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보고서 2025’ 주 내용은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연구소가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보고서 2025’에서 서울·수도권 및 전국 광역시 거주 20~64살 금융소비자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2024년 7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1.4% 포인트(p)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55.8%는 기혼, 40.4%는 미혼으로 분류됐습니다. 미혼 가구의 평균 연령은 35살로, 월평균 소득이 339만 원에 불과했지만, 결혼 후 신혼 3년 차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611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학령기 자녀를 둔 47살 기혼 가구는 월 소득이 702만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성인 자녀를 둔 58살 가구에서 636만 원으로 소폭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 자녀 유무에 따른 자산과 소득 구조의 차이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 간 자산 격차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에서 더욱 두드진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유자녀 가구의 평균 자산은 7억 4,009만 원으로, 무자녀 가구(6억 743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 이상 많았습니다. 유자녀 가구는 금융자산이 1억 4,772만 원, 부동산 자산이 5억 6,493만 원 규모로 집계된 반면, 무자녀 가구는 금융자산 1억 3,003만 원, 부동산 자산 4억 5,626만 원에 그쳤습니다.
또한 자가 보유율에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유자녀 가구의 자가 보유율은 76.2%로 무자녀 가구(62.7%)보다 13.5%p 높았습니다. 이는 자녀 양육을 위한 안정적 주거 마련과 미래 대비 자산 축적의 중요성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 소득 증가와 저축 감소의 상관관계
흥미로운 점은 유자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무자녀 가구보다 40만 원 정도 많았지만, 저축액은 오히려 낮다는 점입니다. 유자녀 가구의 월평균 저축액은 127만 원으로 무자녀 가구(149만 원)보다 20만 원 적었습니다. 이는 교육비와 생활비 등 자녀 양육에 따른 지출 증가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맞벌이 가구 비율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무자녀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75.2%로 유자녀 가구(65.6%)보다 10%p 높았습니다. 이는 자녀 유무가 가계 경제와 소득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하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 연령별 자산과 소득 변화.. 재태크 전략, 나이 따라 달라져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구의 자산과 자가 보유율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평균 연령 35살 미혼 가구 자산은 2억 5,000만 원, 자가 보유율은 33%에 그쳤지만 학령기 자녀를 둔 47살 기혼 가구는 자산 6억 7,000만 원, 자가 보유율 72%를 기록했습니다. 성인 자녀를 둔 58살 가구는 자산 7억 9,000만 원, 자가 보유율 80%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보고서는 “자녀 유무와 연령대에 따라 재테크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라며, “특히 자산 형성과 안정적 주거 마련에 있어 가족 구성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