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에 행정·민사·금융 제재 추가
법원 판결 없이 정부가 기업에 징벌·경제적 책임 물을 수 있어
최대 100억·매출액 3% 수준 검토.. 작업 중지 요건 강화도
경영계 "처벌 피하려는 요식 행위만 늘 것".. 영세업체 부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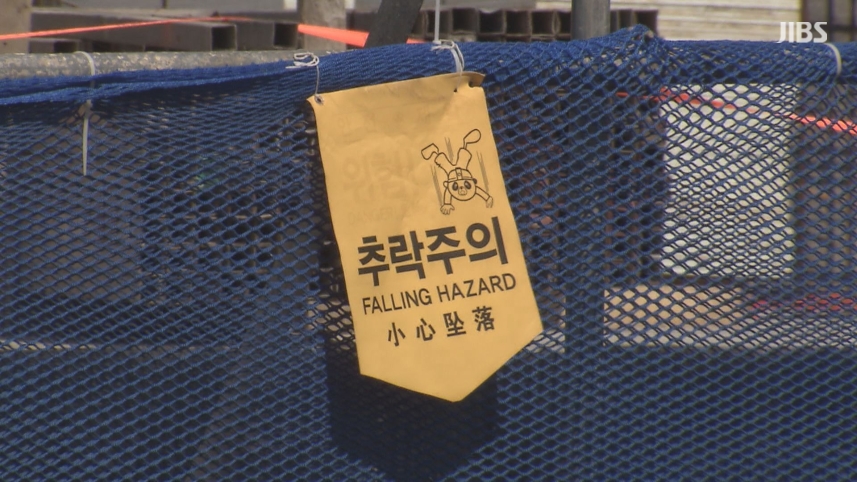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등 중대재해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처벌 조치에 나섭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를 낸 기업에 초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는 형사처벌에 행정·민사·금융 제재까지 결합한 고강도 처벌로 산업재해를 막겠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강화 등 경제적 제재를 검토 중"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지만 실제 실형 선고 사례는 1건에 불과하고, 형사 처벌인 만큼 수사와 판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행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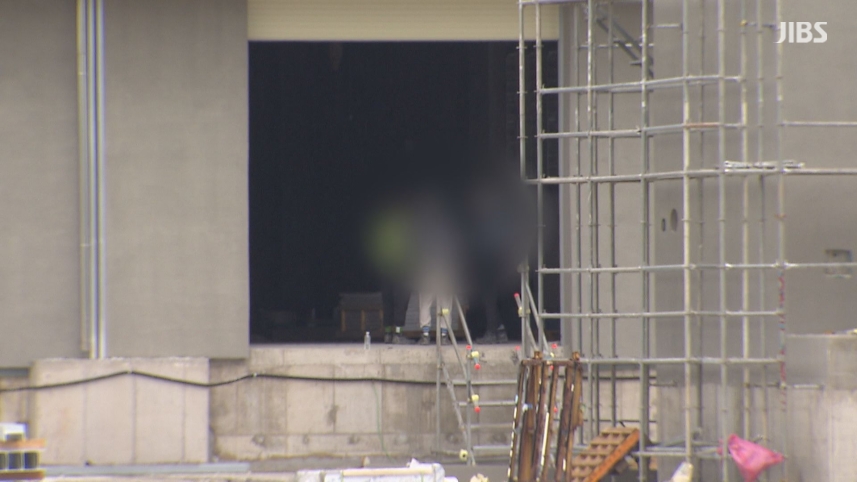
산업안전보건법에 초고액 과징금 제도가 실제로 도입되면,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대신 정부가 기업에 징벌적 경제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과징금 상향 수준은 당정 내에서 아직 논의 중인 단계지만 산업계에선 지난 2020년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정 협의를 거쳐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포함된 '동시에 또는 1년 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최대 100억 원을 부과'하는 조항이나, 건설안전특별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준용한 '최대 매출액의 3%' 수준이 검토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엔 상한액 뿐만 아니라 하한액도 신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공공 입찰 제한과 작업 중지 요건인 '동시 2명 이상 사망' 기준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동시 2명'을 '1명'으로 낮출지, '동시'라는 규정을 수정할지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기업 대출 심사 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반영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금리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금융업계와 협의 중입니다.
여기에 국정기획위원회도 산업재해 근절을 고용·노동 분야의 첫 번째 국정 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영계는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이어 각종 행정 규제 강화가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다중 규제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당장의 처벌을 피하려는 데만 몰두할 수밖에 없고, 요식 행위만 늘어날 것이란 겁니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은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선고된 44건의 중대재해 사건 중 중소기업이 처벌 대상인 경우가 70%(31건)에 달했고, 중견기업은 23%(10건), 대기업은 5%(2건)에 불과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 판결 없이 정부가 기업에 징벌·경제적 책임 물을 수 있어
최대 100억·매출액 3% 수준 검토.. 작업 중지 요건 강화도
경영계 "처벌 피하려는 요식 행위만 늘 것".. 영세업체 부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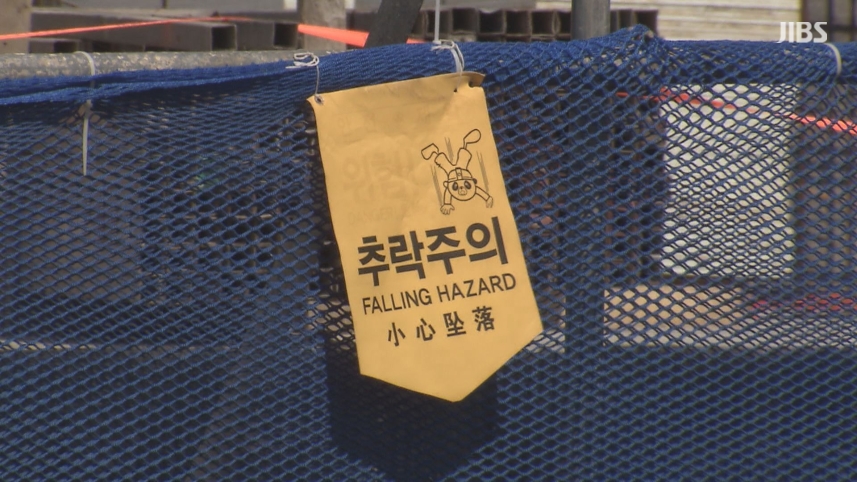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등 중대재해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처벌 조치에 나섭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를 낸 기업에 초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는 형사처벌에 행정·민사·금융 제재까지 결합한 고강도 처벌로 산업재해를 막겠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강화 등 경제적 제재를 검토 중"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지만 실제 실형 선고 사례는 1건에 불과하고, 형사 처벌인 만큼 수사와 판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행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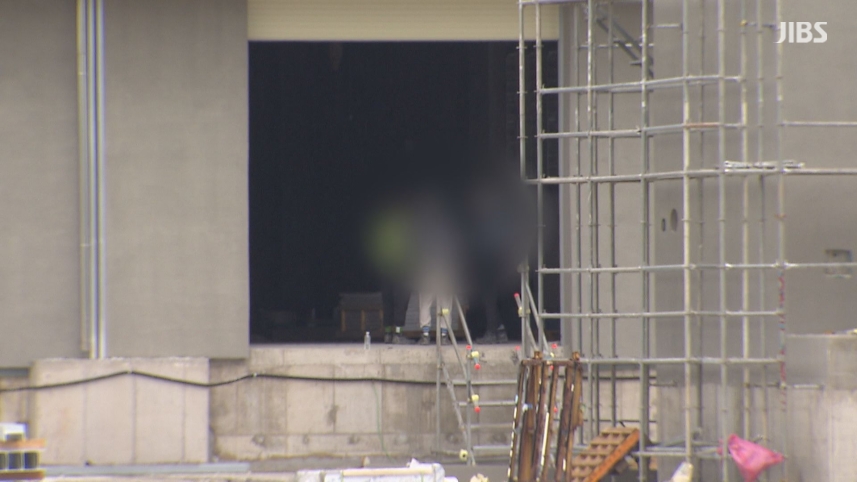
산업안전보건법에 초고액 과징금 제도가 실제로 도입되면,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대신 정부가 기업에 징벌적 경제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과징금 상향 수준은 당정 내에서 아직 논의 중인 단계지만 산업계에선 지난 2020년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정 협의를 거쳐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포함된 '동시에 또는 1년 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최대 100억 원을 부과'하는 조항이나, 건설안전특별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준용한 '최대 매출액의 3%' 수준이 검토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엔 상한액 뿐만 아니라 하한액도 신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공공 입찰 제한과 작업 중지 요건인 '동시 2명 이상 사망' 기준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동시 2명'을 '1명'으로 낮출지, '동시'라는 규정을 수정할지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기업 대출 심사 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반영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금리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금융업계와 협의 중입니다.
여기에 국정기획위원회도 산업재해 근절을 고용·노동 분야의 첫 번째 국정 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영계는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이어 각종 행정 규제 강화가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다중 규제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당장의 처벌을 피하려는 데만 몰두할 수밖에 없고, 요식 행위만 늘어날 것이란 겁니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은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선고된 44건의 중대재해 사건 중 중소기업이 처벌 대상인 경우가 70%(31건)에 달했고, 중견기업은 23%(10건), 대기업은 5%(2건)에 불과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