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 임대소득 전국 평균 1.8배.. 세종·전북 1천만 원대
지역 격차 10배 가까이 벌어져

서울 상위 0.1% 임대업자의 지난해 평균 임대소득이 12억 9,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6억 원 많고, 지방 일부와는 최대 4배 격차입니다.
강남발 집값 급등이 임대업자 소득을 끌어올리는 사이, 서울은 무주택 가구가 절반을 넘어 세입자들은 전·월세 시장에 묶여 있었습니다.
■ 무주택 과반, 서울만의 현실
17일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서울에서 임대소득을 신고한 이는 36만여 명, 총임대소득은 8조 8,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1인당 평균은 2,456만 원으로 전국 평균(1,774만 원)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서울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무주택 가구 비율이 50%를 넘는 지역입니다.
집값은 오르고, 자가 마련은 멀어졌습니다. 그 사이 세입자 절반 이상이 전·월세에 머물며 임대업자의 수익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 ‘13억 클럽’과 지방의 1천만 원대
서울 상위 0.1% 임대업자는 지난해 1인당 평균 12억 9,98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전국 평균(7억 1,000만 원)보다 6억 원 이상 많았고, 부산(5억 3,000만 원)의 2.4배, 경북·경남·대전·충북 등과 비교하면 4배 차이가 났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높은 곳은 제주(6억 8,000만 원), 경기(5억 6,000만 원), 울산(4억 7,000만 원) 순이었지만 서울과의 격차는 여전히 컸습니다.
반면 세종(1,112만 원), 전북(1,116만 원)은 1,000만 원대에 그쳤습니다.
지역별 양극화가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됩니다.

■ 전세 대출 막히자 월세 전환 가속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전세 시장은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불안정해졌습니다.
임차인 상당수가 월세로 밀려나면서 임대업자의 수익은 한층 안정적인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셋값 상승과 매물 부족으로 세입자들이 월세로 떠밀리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월세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등 제도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올해 더 벌어진다.. ‘양극화’ 경고등
올해 연말 공개될 2024년 귀속분 통계에서는 격차가 더 선명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집값 상승률이 전국을 압도했던 만큼, 상위 임대업자의 소득은 한층 더 오르고 무주택 가구의 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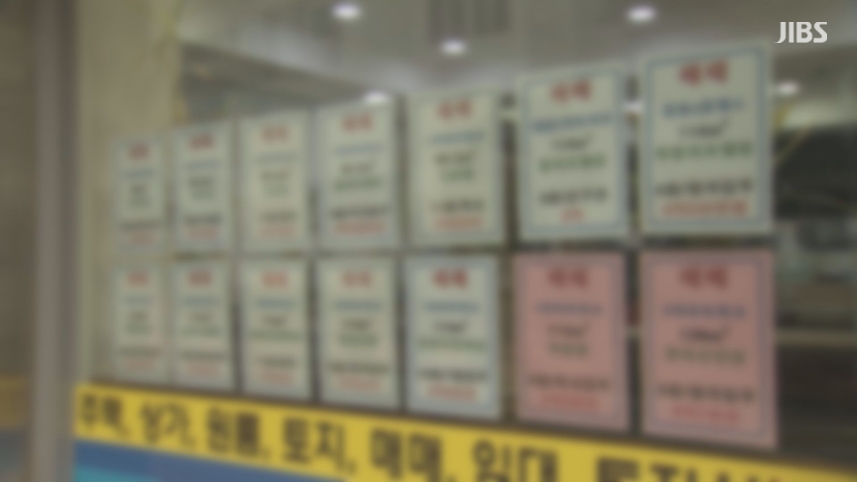
서울 통계는 그저 ‘13억 클럽’이란 숫자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시민 절반이 집 없이 월세로 살고, 극소수는 매년 수십억 원대 임대수익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이는 곧 주거 안정성을 흔드는 경고 신호로 읽힙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집 없는 세입자의 불안과 극소수 임대부자의 과도한 수익이 공존하는 흐름은 제도적 대응 없이는 갈등을 더 깊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역 격차 10배 가까이 벌어져

서울 상위 0.1% 임대업자의 지난해 평균 임대소득이 12억 9,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6억 원 많고, 지방 일부와는 최대 4배 격차입니다.
강남발 집값 급등이 임대업자 소득을 끌어올리는 사이, 서울은 무주택 가구가 절반을 넘어 세입자들은 전·월세 시장에 묶여 있었습니다.
■ 무주택 과반, 서울만의 현실
17일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서울에서 임대소득을 신고한 이는 36만여 명, 총임대소득은 8조 8,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1인당 평균은 2,456만 원으로 전국 평균(1,774만 원)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서울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무주택 가구 비율이 50%를 넘는 지역입니다.
집값은 오르고, 자가 마련은 멀어졌습니다. 그 사이 세입자 절반 이상이 전·월세에 머물며 임대업자의 수익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 ‘13억 클럽’과 지방의 1천만 원대
서울 상위 0.1% 임대업자는 지난해 1인당 평균 12억 9,98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전국 평균(7억 1,000만 원)보다 6억 원 이상 많았고, 부산(5억 3,000만 원)의 2.4배, 경북·경남·대전·충북 등과 비교하면 4배 차이가 났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높은 곳은 제주(6억 8,000만 원), 경기(5억 6,000만 원), 울산(4억 7,000만 원) 순이었지만 서울과의 격차는 여전히 컸습니다.
반면 세종(1,112만 원), 전북(1,116만 원)은 1,000만 원대에 그쳤습니다.
지역별 양극화가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됩니다.

■ 전세 대출 막히자 월세 전환 가속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전세 시장은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불안정해졌습니다.
임차인 상당수가 월세로 밀려나면서 임대업자의 수익은 한층 안정적인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셋값 상승과 매물 부족으로 세입자들이 월세로 떠밀리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월세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등 제도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올해 더 벌어진다.. ‘양극화’ 경고등
올해 연말 공개될 2024년 귀속분 통계에서는 격차가 더 선명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집값 상승률이 전국을 압도했던 만큼, 상위 임대업자의 소득은 한층 더 오르고 무주택 가구의 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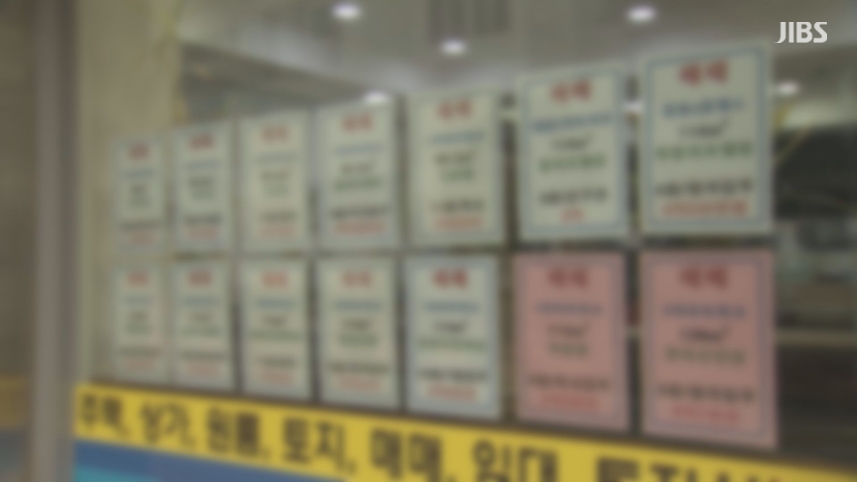
서울 통계는 그저 ‘13억 클럽’이란 숫자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시민 절반이 집 없이 월세로 살고, 극소수는 매년 수십억 원대 임대수익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이는 곧 주거 안정성을 흔드는 경고 신호로 읽힙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집 없는 세입자의 불안과 극소수 임대부자의 과도한 수익이 공존하는 흐름은 제도적 대응 없이는 갈등을 더 깊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