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권 단체 패키지 여전, 일본 영향 제한적
북미 다도시 경유형... 유럽, 항공·콘텐츠 전략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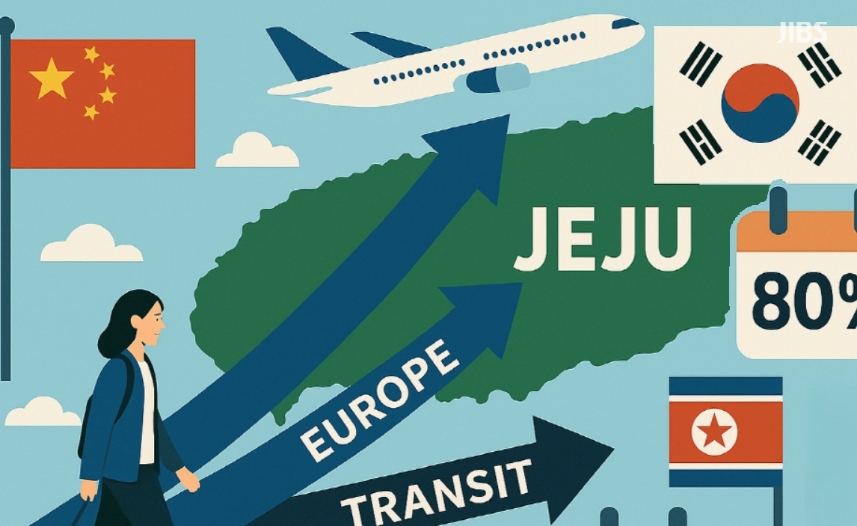
전국적인 무비자 확대는 모든 시장을 똑같이 흔들지 않습니다.
중화권, 일본, 북미, 유럽.
거주국별 여행 패턴은 이미 서로 다른 길을 그리고 있었고, 이번 제도 변화는 그 차이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번 3편에서는 시장별 패턴과 전망을 짚고, 특히 유럽권을 겨냥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적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 중화권: 단체 중심, ‘제주만 여행’ 견고
중화권은 여전히 단체 패키지에 무게가 실립니다.
무비자 확대가 시행되면 단체 유입에는 추가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직항이 있는 도시에서는 ‘제주만 체류’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이 구조가 단기간에 크게 바뀌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중국 단체 수요는 무비자 시행으로 더 늘 것”이라며, “서울로 빠져나가는 것만 아니라 서울·부산과 제주를 묶는 상품이 병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 일본: 무비자 확대 영향 제한적
일본은 이미 단기 무비자 제도가 시행 중이라, 이번 중국 단체 무비자 확대와의 직접적인 연관은 크지 않습니다.
업계는 “일본 시장은 무비자보다는 항공 스케줄, 환율, 콘텐츠 경쟁력이 더 중요한 변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 북미: 다도시 경유형, 체류일수 긴 고급 수요
북미는 장거리 이동 탓에 다(多)도시 경유형이 일반적입니다.
서울·부산을 거쳐 제주를 찾는 방식이 주류이고, 체류일수는 길며 숙박·레저·체험 소비 수준도 높은 편입니다.
이른바 ‘고부가가치’ 관광 수요로 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광 통계에서 국적별 투숙률이 세부적으로 구분되진 않지만, 일부 특급호텔은 외국인 고객 비중이 전체 투숙객의 30~4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수기 주말에는 객실 점유율(OCC)이 90%에 육박하며, 외국인 투숙률이 70%를 넘는다는 내부 통계도 확인됩니다.
한 도내 특급호텔 관계자는 “북미권 고객만 따로 분리된 수치는 없지만, 체류일수가 길어 객실 매출에 기여도가 높다”며, “최근 외국인 시장 증가세 속에, 이들의 체류일수를 늘리고 소비의 질을 끌어올리는 게 업계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유럽: 하늘길 검토, 장기체류·콘텐츠 전략 준비
유럽은 직항이 없어 접근성이 낮지만, 최근 정책 차원에서 하늘길 확충을 내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두 번 노선을 여는 데 그치지 않고, 단계적 확대를 통해 고부가가치 장기체류 관광으로 연결하려는 전략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유럽 관광객은 특유의 장기체류 성향이 있어, 그저 관광객을 유치하고 늘리는데서 나아가 고부가가치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자연·문화·웰니스·레저를 아우르는 맞춤형 콘텐츠 전략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웰니스 프로그램이나 스포츠·레저와 접목, 장기 렌탈형 숙박, 지역 투어 콘텐츠 등은 유럽권을 겨냥한 핵심 아이템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주만의 환경적 매력과 결합할 경우, 장기체류형 관광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 이어지는 이야기
시장별 패턴은 곧 무비자 전국 확대 이후 제주가 맞닥뜨릴 현실입니다.
중화권은 여전히 단체 패키지가 견고하고, 일본은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북미는 경유형 확산 속에서 제주의 체류일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유럽은 항공시장 확장과 장기체류 콘텐츠 전략 검토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습니다.
결국 제주의 과제는 방문객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국적별·지역별로 다른 여행 방식을 읽어내고, 이를 체류 방식의 전략적 전환으로 이어갈 해법을 찾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다음 4편에서는 무비자 제도가 실제로 숙박·소비·고용 등 지역 경제 구조를 어떻게 흔들고, 어디까지 재편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미 다도시 경유형... 유럽, 항공·콘텐츠 전략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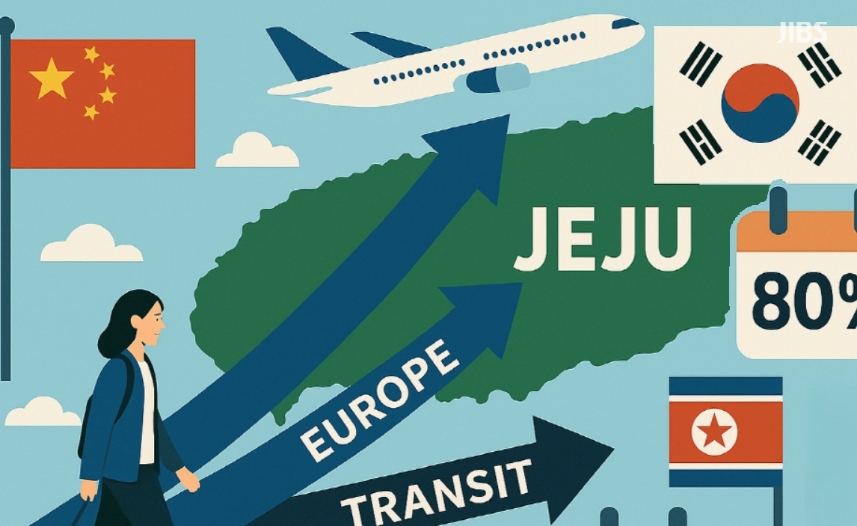
무비자 전국 확대를 기점으로, 중화권·북미·유럽 등 시장별 여행 패턴 변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전국적인 무비자 확대는 모든 시장을 똑같이 흔들지 않습니다.
중화권, 일본, 북미, 유럽.
거주국별 여행 패턴은 이미 서로 다른 길을 그리고 있었고, 이번 제도 변화는 그 차이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번 3편에서는 시장별 패턴과 전망을 짚고, 특히 유럽권을 겨냥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적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 중화권: 단체 중심, ‘제주만 여행’ 견고
중화권은 여전히 단체 패키지에 무게가 실립니다.
무비자 확대가 시행되면 단체 유입에는 추가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직항이 있는 도시에서는 ‘제주만 체류’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이 구조가 단기간에 크게 바뀌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중국 단체 수요는 무비자 시행으로 더 늘 것”이라며, “서울로 빠져나가는 것만 아니라 서울·부산과 제주를 묶는 상품이 병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 일본: 무비자 확대 영향 제한적
일본은 이미 단기 무비자 제도가 시행 중이라, 이번 중국 단체 무비자 확대와의 직접적인 연관은 크지 않습니다.
업계는 “일본 시장은 무비자보다는 항공 스케줄, 환율, 콘텐츠 경쟁력이 더 중요한 변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 북미: 다도시 경유형, 체류일수 긴 고급 수요
북미는 장거리 이동 탓에 다(多)도시 경유형이 일반적입니다.
서울·부산을 거쳐 제주를 찾는 방식이 주류이고, 체류일수는 길며 숙박·레저·체험 소비 수준도 높은 편입니다.
이른바 ‘고부가가치’ 관광 수요로 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광 통계에서 국적별 투숙률이 세부적으로 구분되진 않지만, 일부 특급호텔은 외국인 고객 비중이 전체 투숙객의 30~4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수기 주말에는 객실 점유율(OCC)이 90%에 육박하며, 외국인 투숙률이 70%를 넘는다는 내부 통계도 확인됩니다.
한 도내 특급호텔 관계자는 “북미권 고객만 따로 분리된 수치는 없지만, 체류일수가 길어 객실 매출에 기여도가 높다”며, “최근 외국인 시장 증가세 속에, 이들의 체류일수를 늘리고 소비의 질을 끌어올리는 게 업계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유럽: 하늘길 검토, 장기체류·콘텐츠 전략 준비
유럽은 직항이 없어 접근성이 낮지만, 최근 정책 차원에서 하늘길 확충을 내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두 번 노선을 여는 데 그치지 않고, 단계적 확대를 통해 고부가가치 장기체류 관광으로 연결하려는 전략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서귀포 치유의 숲.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유럽 관광객은 특유의 장기체류 성향이 있어, 그저 관광객을 유치하고 늘리는데서 나아가 고부가가치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자연·문화·웰니스·레저를 아우르는 맞춤형 콘텐츠 전략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웰니스 프로그램이나 스포츠·레저와 접목, 장기 렌탈형 숙박, 지역 투어 콘텐츠 등은 유럽권을 겨냥한 핵심 아이템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주만의 환경적 매력과 결합할 경우, 장기체류형 관광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화 바다에서 여유를 즐기는 여행객 모습. 장기체류형 웰니스 관광 자원으로 주목받는 제주의 풍경. (제주관광공사 제공)
■ 이어지는 이야기
시장별 패턴은 곧 무비자 전국 확대 이후 제주가 맞닥뜨릴 현실입니다.
중화권은 여전히 단체 패키지가 견고하고, 일본은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북미는 경유형 확산 속에서 제주의 체류일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유럽은 항공시장 확장과 장기체류 콘텐츠 전략 검토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습니다.
결국 제주의 과제는 방문객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국적별·지역별로 다른 여행 방식을 읽어내고, 이를 체류 방식의 전략적 전환으로 이어갈 해법을 찾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다음 4편에서는 무비자 제도가 실제로 숙박·소비·고용 등 지역 경제 구조를 어떻게 흔들고, 어디까지 재편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무비자 확대 이후 관광 소비가 제주 지역 상권과 경제 구조로 이어지는 흐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