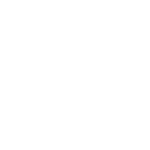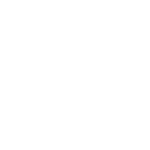제주 예비검속...4.3 연장선상에서 실체규명 중요
1950년 미 대사관 보고서는 당시 제주 지역 실태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에 밀려나던 시기, 제주를 우리나라 정부의 최후 보루로 삼으려는 준비 작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비검속으로 총살된 수많은 희생자가 있지만, 아직 그 실체에 접근하기에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에서 자행된 예비검속 학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당시 제주의 예비검속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제주를 대한민국 정부의 마지막 보루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 대사관 보고서에도 제주에 당시 2천여명의 해병대 장교와 1천6백명의 신병이 있다는 병력과 치안 상황이나,
제주지역의 공산주의 전단 기록 등 구체적 상황까지 자세히 기록됐다는 건 이런 사전 준비 성격을 띈다는 의밉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예비검속의 희생자가 됐던 국민보도연맹에 대한 제주 지역 특징도 주목됩니다.
보고서에 나온 제주지역 국민보도연맹 회원은 무려 2만7천명.
당시 제주는 4.3을 거치면서 군경의 의심을 샀던 주민 상당수가 희생돼 보도연맹을 조직해 관리할 필요가 없었지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는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의 보도연맹 조직 시기와 예비검속과의 연관성 등은 아직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밝혀지지 않은 상탭니다.
심지어 제주경찰서에 수감됐던 북부 예비검속 희생자 유해는 아직 찾지 못해 어디서, 어떻게 희생됐는지 확인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 예비검속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육지 형무소에서 돌아가신 분도 억울하지만, 특히 양민증을 받은 사람은 철저히 보호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죽이면 더 억울한거 아닙니까. 상당히 과제가 많습니다"
"아직도 땅 속에 묻혀 있는 예비검속의 진상을 규명하고 기억하는 일은 여전히 우리들의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