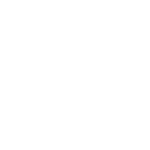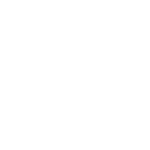6.25 70주년...제주 예비검속 피해 재조명 필요
(앵커)
오늘(25)은 6.25 전쟁이 발발한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제주에선 4·3의 연장선에서 수많은 양민들이 '예비검속'이란 틀안에 갇혀 수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혐의자를 미리 잡아 놓은 예비검속은 범죄 경중에 따라 A부터 D등급으로 나눠졌는데, 아직 분류 기준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예비검속에 대한 기록 조사권을 발동해야 하는 이윱니다.
김동은 기자가 비극적인 예비검속의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만들어진 경찰 문건입니다.
경찰 국장이 제주 지역 각 경찰서장들에게 예비검속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제출된 명단은 범죄 경중에 따라 A부터 D 등급으로 나눠졌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분류된건지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좌익이나 반정부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예비 검속에 들어갔습니다.
4·3을 겪었던 제주는 그 연장선상에서 예비검속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일부 피해 지역은 진상 조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아직 한구의 유해도 찾아내지 못한 곳이 많아, 여전히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홍성효 북부예비검속희생자 유족회장
(인터뷰)-(자막)-"6.25 때문에 많은 희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도 정부에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됐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울합니다. 항상 이 때가 되면 여기와서 한번 둘러보고..."
당시 경찰서별 예비검속 희생자 규모를 보면, 성산포를 제외하고 1백에서 2백명씩 모두 560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희생자의 70% 이상은 2, 30대였고, 좌익이나 반정부활동과 아무 관련 없는 10대도 10%나 됩니다.
예비검속이 무차별적이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록으로 남아 있는 제주도내 예비검속 희생자 숫자는 관련 증언에 비하면 휠씬 적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가 많은데다, 워낙 은밀하게 예비검속이 이뤄져 관련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정심 4·3 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인터뷰)-(자막)-"우리가 경찰쪽으로 (자료를) 문의하고, 경찰에서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 더 군경의 기록들이 남아있다면, 혹은 남아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권의 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한국전쟁 70주년의 역사 속엔 예비검속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제주의 아픈 비극도 함께 녹아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