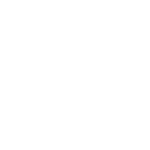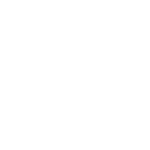제주, 4·3 기획, 2. 종남궤엔 누가 피신?...피난 경로 역추적
(앵커)
JIBS는 4·3 당시 토벌대의 학살을 피해 피신했던 한라산의 종남궤 피신처를 처음 확인해 실상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한라산 중턱의 종남궤까지 누가 피신을 왔었을까요?
당시 중산간 마을 주민들의 피신 경로를 역추적해 봤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한라산 중턱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작은 동굴 '종남궤'.
이곳에서 사람 유해가 나왔다는 얘기까지 처음 확인되면서 4·3 당시 주민들의 피신처로 추정됩니다.
그럼 이 종남궤엔 누가 피신을 왔을까?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가장 큰 마을이었던 무등이왓은 4·3 당시 불에 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막)-"4·3 일어나니까 우리 동광은 다 망해버렸지, 사촌도 하나없이 멸족해 버린 집도 있고..."
무차별 토벌 작전이 벌어졌던 지난 1948년 12월.
토벌대는 마을 주민들을 학살한 후 잠복해 있었습니다.
(자막)-"저기 모아 놓고, 죽창으로 마구 찔러서 불 태워버린 곳이 저기라"
다음날 시신을 수습하러 온 주민들을 산채로 붙잡아 불태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홍춘호 할머니/서귀포시 안덕면
(인터뷰)-(자막)-"불을 붙여버린거지, 불을 붙이니까 사람들은 죽지 않았으니까, 막 뒹굴어, 사람 살려달라고 울고..."
제주 4·3 학살 가운데 가장 잔혹한 학살로 불리는 잠복 학살입니다.
이동현 제주 4·3 연구소 연구원
(인터뷰)-(자막)-"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불태워 죽였다. 이건 어떤 이유가 있던 간에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
공포에 질린 무등이왓 등 동광리 주민 상당수는 인근 큰넓궤로 피신했습니다.
칠흑같은 어둠속에서 40여일을 버텼습니다.
홍춘호 할머니/서귀포시 안덕면
(인터뷰)-(자막)-"(동굴에서 물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거 빨아먹으면서 살았다. (아버지에게) 밤이라도 하늘 한번 보여달라고 하면 '나가면 죽는다. 시국 편안해지면 그때 나가서 하늘보자'..."
하지만 큰넓궤마저 토벌대에 발각되고, 주민들은 뿔뿔히 흩어져 피난길에 오릅니다.
지난 1997년 발간된 제주도의회 4·3 피해 조사 보고서에는 당시 동광리 주민들이 한라산 영실로 피난 갔다는 증언이 남아있습니다.
한라산 영실 즉, 볼레오름 인근은 종남궤가 있는 곳입니다.
무등이왓에서 큰넓궤로, 다시 돌오름에서 결국 한라산 영실 인근의 볼레오름까지.
직선거리로도 20킬로미터나 되는 죽음의 피난길이었던 셈입니다.
한상봉 한라산 인문학 연구가
(인터뷰)-(자막)-"토벌작전이 벌어져서 돌오름이 안전하지 못한거에요. 안전하지 못하니까 이분들이 다시 자신들이 생활했던 터전 중에 한 곳인 볼레오름으로 오는데..."
하지만 목숨을 건 피난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눈길을 쫓아온 토벌대는 종남궤가 있던 한라산 볼레오름 인근에서 피난민들을 붙잡아 정방폭포에서 집단 학살합니다.
정방폭포에서 학살된 주민 230여명 가운데 동광리 주민이 30여명으로 가장 많았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4·3당시 동광리부터 시작된 학살과 피난의 역사가 한라산 구석구석에 베어있지만,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어 한라산 피난의 역사는 여전히 아픔으로 묻혀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