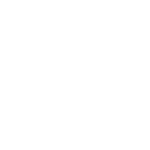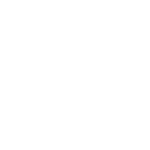(4·3 기획)5. 소리없는 통곡..한라산 피난의 역사
(앵커)
제주 4·3 기획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난해부터 JIBS는 한라산과 중산간 지역의 4·3 피난처들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산간과 한라산은 4·3 당시 실상을 그대로 안고 있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련 조사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 중산간 고지대에서 발견된 수많은 탄피들은 4·3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짐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지난 1949년 3월 한라산에서 내려오면 살려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하산한 피난민만 1만명에 이를 정도로,
중산간 마을 주민 상당수가 한라산까지 올라가 몸을 숨겼습니다.
극도의 추위와 배고픔 속에 수많은 피난민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지지만, 아직도 정확한 실상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은희 / 제주4·3연구소 연구실장
"살기 위해서 제주도 사람들이 토벌 작전을 피해서 올라가고, 올라간 곳이 한라산이고,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한 마지막 장소가 한라산이었던 것이죠"
한라산 피난처에서 확인되는 작은 흔적들 조차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별다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70년이 넘는 긴 세월 속에 그대로 방치돼 잊혀지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자
"한라산에는 4·3 당시 피난민들이 숨어 들었던 이런 피난처들이 곳곳에 산재돼 있지만, 아직 제대로된 조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4·3 진상 조사가 접근성이 좋고, 증언자가 많은 해안마을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상대적으로 중산간 고지대와 한라산에 대한 조사는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긴 세월 속에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차 사라지고,
위치 확인에 가장 중요한 당시 지명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상봉 / 한라산 인문학 연구가
"(증언을 토대로)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현재는 한라산에 있는 지명이 연구가 되지 않다보니까, 한라산에 대한 지명이 우선 조사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4·3 당시 증언 속에 있는 지명을 찾아서..."
제주자치도가 올해 처음 4·3 관련 한라산 유적지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지만,
예산은 고작 2천만원 수준이라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장기 계획 수립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식 / 제주문화진흥재단 이사장
"한라산에 있는 4·3 유적과 당시 주민들의 생활상을 전반적으로 같이 조사해야 4·3의 실상, 전모가 드러난다"
4·3 당시 중산간에서 한라산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피난 경로와 피난처, 그리고 무력 충돌의 흔적들.
70년 넘게 묻혀 있는 이 소리없는 통곡에 우리가 대답해야 할 시점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제주방송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