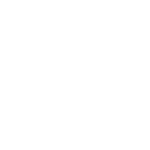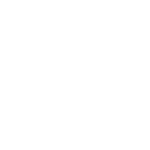4·3 미국 책임 규명 난항
(앵커)
제주 4·3 행방불명이나 학살 피해에 대한 책임은 미국도 피할 수 없습니다.
4·3 당시 군대와 경찰에 대한 지휘, 통제를 미군이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의 보이지 않는 손을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1948년 11월 군경의 강경진압으로 대규모 4·3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주한 미육군 군사고문단은 강경 진압을 총괄한 송요찬 당시 9연대장이 강력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싹쓸이하기 위해 제주에 1개 대대를 추가 파병하겠다는 한국군 제안에 주한미 군사고문단장은 최고 수준의 생각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미군이 가혹했던 4·3 강경 진압을 막기는 커녕, 조장했다는 얘깁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장군 사이에 체결된 한미군사안전 잠정협정서를 보면,
주한미군이 경찰을 포함한 국방군에 전면적인 작전 통제권을 가지도록 돼 있습니다.
4·3 양민 학살을 비롯해 군법회의와 형무소, 행방불명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역사마다 미국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깁니다.
김종민 전 국무총리 소속 4·3 위원회 전문위원
(싱크)-(자막)-"학살극이 벌어질 때에도 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은 미군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미군이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군에 의해서 학살극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역시도 미군은 그 책임에서 단 한발짝도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는 미국의 책임을 묻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4·3 진상조사보고서 해외 자료 가운데 90% 가량이 미국 자료고, 지난해 미국 현지 조사로 기록들이 추가 수집됐지만,
아직 직접적인 최고 명령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정심 제주 4·3 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인터뷰)-(자막)-"(조사는)미 국무부, 국방부, 합동참모부에 이르기 까지 주한미군 위에 있었던 상위 그룹 중심으로 미국의 책임 문제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들이기 때문에..."
게다가 올해 코로나 19 여파로 내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던 미국 현지 자료 조사도 중단된 상탭니다.
제주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선 추가 자료가 더 많이 확보돼야하고, 그래서 이를 뒷받침한 지원 대책이 절실합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