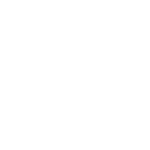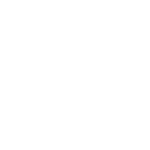관리 인력은 '번아웃'...확진자는 '더블링'
(앵커)
오늘(23일) 새벽 0시를 기준으로 1,700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시 지역 확진자가 전체 80%에 달하면서 보건소와 의료원은 과부화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은 없는 상탭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코로나19 확진자가 온라인으로 기입한 정보를 보건소 직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확진자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빠진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21명의 전담직원이 한 명당 20명의 확진자를 늦은 새벽 시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코로나19 전체 확진자의 80%가 제주시에 몰리면서 업무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
"근무시간이라는 게 아예 없고 밤낮없이 일하면서 급할 때는 책상에서 엎드려 자면서.. 눈 뜨면 보건소 화장실 가서 씻고 다시 일에 투입되는 수준이에요."
관리 인력의 '번아웃'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연일 폭증하고 있습니다.
김연선 기자
"오미크론 확산세에 ‘더블링’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역대 가장 많게 하루 1,7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6일 확진자 수는 882명.
하루 뒤 1,000명 대를 기록했고, 일주일 만에 2배 늘어나면서 확진자 수는 1,762명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과로로 쓰러지는 의료진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한시적으로라도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제주자치도는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인력 충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제주방송 김연선(sovivid91@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