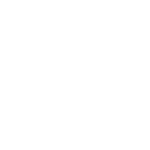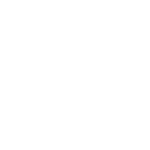(4·3 기획)3. 어떻게 산에 올랐나?...표고밭.방목길 주목
(앵커)
JIBS는 제주 4·3 74주년을 맞아 중산간 주민들의 피난처 등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토벌대의 무차별 학살을 피해 중산간 마을 주민들은 더 높은 고지대와 한라산으로 피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선으로 이동했는지, 왜 결국 한라산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탄피가 무더기 발견된 일명 '들굽궤 오동이' 지역.
이 일대는 제주시 애월읍 지역 주민들이 한라산으로 이동하는 주요 피난 동선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당시 주민들은 왜 피난처로 중산간 고지대와 한라산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을까?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마을 중에 가장 고지대에 위치한 한 마을.
이 마을은 4·3 초기부터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창선(89세) / 유수암리 주민
"그 당시에 불 타서 아무것도 없었지, 집 한채가 어디 있었겠나..."
주민 70여명이 살았던 범미왓, 일명 동카름 마을은 집이 모두 불에 타 없어지면서 이제는 표석만 남아있습니다.
이곳에서 아버지를 잃은 강창휴 할아버지는 참혹했던 그 당시가 생생합니다.
당시 해안마을로 내려오라는 소개령까지 내려졌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강창휴 / 유수암리 주민
"밑(해안마을)에 내려갔다고 보호해 줄리가 없고, 위에도 보호해 줄 곳이 없어. 다 자기가 임시로 살기 위해서..."
결국 주민들은 평소 소와 말을 방목하러 다녔던 중산간 고지대의 길.
주민들만 알고 있는 그 길을 따라 중산간 고지대와 한라산으로 피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강창휴 / 유수암리 주민
"(예전에는) 한라산에 소와 말들이 다니고, 사람 다니는 길이 있어, 올라가는 길이..크게 길을 빼놓은건 아니고, 사람이 다니니까 길이 생긴거야"
주민들의 피난 동선은 단순히 방목길 밖에 없었을까?
당시 한라산에 피신했다는 한 주민에게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현상돈(80세) / 제주시 아라동
"그 길이 있었지, 초기밭(표고밭) 가는...거의 초기밭(표고밭) 인근에서 방목했지..."
초기밭, 즉 일제시대부터 한라산 곳곳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던 일명 표고밭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증언의 위치는 해발 900미터 이상되는 한라산 중턱입니다.
관음사에서 남쪽으로 2킬로미터 부근까지 올라가야 하는 곳입니다.
당시 27임반이라 불리는 이 표고밭을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한라산 관음사에서 2시간 가량 산길을 올랐습니다.
깊은 산속에 무너진 한 건물이 확인됩니다.
표고버섯을 키웠던 현장입니다.
당시 주민들은 이 표고밭 길을 따라 한라산에 올라, 뿔뿔히 흩어져 몸을 숨겼다는 얘깁니다.
현상돈(80세) / 제주시 아라동
"전부 이곳 사람들은 전부 위로만 올라갔거든. 한라산에 안 올라가면 살 수가 없어. 여기서 손가락질 하고 폭도가 살고 있다고 하면 그냥 다 잡혀가고, 잡혀가고..."
김은희 / 제주 4·3 연구소 연구실장
"(당시) 생활 터전이 대부분 방목, 목장길, 초기밭(표고밭)...초기밭(표고밭)이 터전이 다져져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일제 시대 생긴 초기밭(표고밭)이 나중에 4.3 피난민들이 활용했던 장소로..."
4·3 당시 제주 중산간 주민들의 목숨을 건 생명길이었던 방목길과 한라산 표고밭.
이 흔적을 추적하는게 4·3 피난민들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인 셈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제주방송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