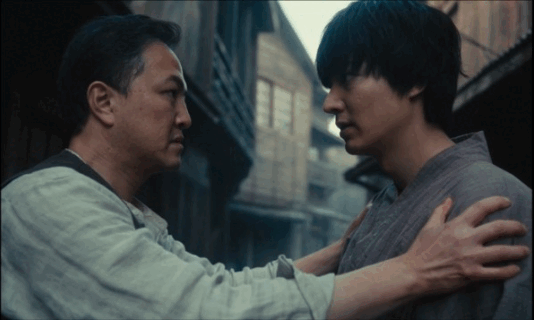
파친코 7화 캡쳐, 파친코 촬영장 및 배우, 제주어 대본 작업 참여한 연극인 변종수씨(변종수씨 SNS) © JIBS 제주방송
[드라마「파친코」'제주의 아픔 담아냈다']
①생계 위해 떠난 아픈 여정
②제주인이 만든 기적 '이쿠노구'
③세상을 바꿔 낸 '오사카 송금'
④70여년 만에 다시 밟은 '고향 제주'
⑤생생한 '제주 사투리' 이래서 넣었다.
⑥일제에 맞서 지켜 낸 '민족혼·정체성'
⑦기억만으로 전해지는 '아픈 역사'
드라마 '파친코' 7화는 제주출신의 남자 주인공 고한수 부자의 일본 정착기 얘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고한수 역을 맡은 배우 이민호와 아버지 역의 정웅인이 쉴새 없이 제주 사투리를 쏟아냅니다.
"사람은 혼가지만 졸바로 허민 된댄 허난"(사람은 한가지만 제대로 하면된다)
"게민 난 뭘 잘 허민 되는디 마씨?"
(그럼 전 뭘 잘하면 되는건가요?)
"그게 무신 느 모심냥 정해지는 줄 알암시냐?"
(그게 뭐 너 마음처럼 정해지는 줄 아느냐?)
"경 부탁허는디 게민 어떵허나?"
(그렇게 부탁하는데 그럼 어떡하냐?)
"안된댄 해사주마씨"
(안된다고 해야죠)
"한수야 눈을 호꼼 높여보라. 우리 아들 이추룩잘 나신디"
(한수야 눈을 조금만 높여봐라, 우리 아들 이렇게 잘 났는데)
1923년 일본 요코하마에 정착한 고한수 부자는 일본인들의 차별을 겪으면서도 나름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한수가 일본에서의 천대 받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충고는 끊임없이 이어갑니다.
원작에 없는 '제주인' 그려내
이런 고한수 부자의 얘기는 원작 소설엔 없는 내용입니다.
드라마 '파친코' 제작진이 원작소설에도 없는 제주출신 고한수 부자의 얘기를 비중있게 다룬 건 그만큼, 일제 강점기 일본 내에서 재일 제주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산업혁명으로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1910년대 부터 적잖은 제주인들이 일본으로 일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제주인들이 값싸고 일 잘한다는 평판이 나면서, 제주와 오사카는 직행하는 여객선 군대환이 1922년 취항합니다.
1920년대 재일제주인 조명
굳이 당시 인구가 채 20만명도 안되던 제주를 연결하는 여객선을 운항했던 건,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공장에 필요한 인력이 제주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1923년 9월 고한수 부자가 겪은 관동 대지진 당시 일본으로 건너가 있던 제주인은 만명이 넘는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조선인에 대한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조선인 대학살이 이어지는 과정에 분명 적잖은 제주인들도 희생이 됐을겁니다.
이런 아픈 경험을 겪는 고한수의 성장기를 그리는 과정에 제주인들의 얘기는 반드시 필요했고, 완벽한 제주 사투리를 담아내야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드라마 '파친코' 제작진은 배역진들의 제주어 사투리 대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대본 작업때 부터 공을 들였습니다.
제주 연극인 '변종수'씨 대본 작업 참여
주연급 제주어 연기 지도
영문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한 대본에 제주 사투리를 입히기 위해 제주에서 연극배우로 활동중인 변종수씨를 선택했습니다.
변종수씨는 지난해 3월 캐나다로 출국해 대본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자가격리까지 해야 했던 시기였지만, 제작진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했습니다.
변씨는 제주어 대본 작업 뿐만 아니라, 배우 이민호와 정웅인씨의 제주어 연기 지도까지 맡았습니다.
중간중간 효과음처럼 들리는 제주사투리 가운데 변씨가 녹음한 대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제작진, "제주어 알리고 싶었다"
"제주어가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데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어서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배우 뿐만 아니라 제작자들도요.
하지만 소설 '파친코'를 쓴 이민진 작가와 감독 겸 프로듀싱을 담당한 수휴가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알리고 싶다며 제주어를 꼭 넣어야한다고 해서 제주어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변씨가 SNS에 올린 '파친코' 제주어 제작 과정의 뒷 얘깁니다.
제주 사투리는 다른 드라마에선 어미만 살짝 바꾸거나 감탄사만 넣어 어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파친코'는 현재 제주 토박이들이 사용하는 말투 그대로를 사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어 대사를 하는 배우들이 연습하면 다 할 수 있다며, 쉽지 않은 제주 사투리의 억양과 어투를 수 없이 반복해 완성도를 높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파친코'가 생생한 제주어를 그대로 담아내면서 일제 강점기 재일 제주인들의 한 맺힌 삶과 차별을 딪고 성장하는 후손들의 얘기가 더 진솔하게 와 닿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①생계 위해 떠난 아픈 여정
②제주인이 만든 기적 '이쿠노구'
③세상을 바꿔 낸 '오사카 송금'
④70여년 만에 다시 밟은 '고향 제주'
⑤생생한 '제주 사투리' 이래서 넣었다.
⑥일제에 맞서 지켜 낸 '민족혼·정체성'
⑦기억만으로 전해지는 '아픈 역사'
드라마 '파친코' 7화는 제주출신의 남자 주인공 고한수 부자의 일본 정착기 얘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고한수 역을 맡은 배우 이민호와 아버지 역의 정웅인이 쉴새 없이 제주 사투리를 쏟아냅니다.
"사람은 혼가지만 졸바로 허민 된댄 허난"(사람은 한가지만 제대로 하면된다)
"게민 난 뭘 잘 허민 되는디 마씨?"
(그럼 전 뭘 잘하면 되는건가요?)
"그게 무신 느 모심냥 정해지는 줄 알암시냐?"
(그게 뭐 너 마음처럼 정해지는 줄 아느냐?)
"경 부탁허는디 게민 어떵허나?"
(그렇게 부탁하는데 그럼 어떡하냐?)
"안된댄 해사주마씨"
(안된다고 해야죠)
"한수야 눈을 호꼼 높여보라. 우리 아들 이추룩잘 나신디"
(한수야 눈을 조금만 높여봐라, 우리 아들 이렇게 잘 났는데)
1923년 일본 요코하마에 정착한 고한수 부자는 일본인들의 차별을 겪으면서도 나름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한수가 일본에서의 천대 받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충고는 끊임없이 이어갑니다.
원작에 없는 '제주인' 그려내
이런 고한수 부자의 얘기는 원작 소설엔 없는 내용입니다.
드라마 '파친코' 제작진이 원작소설에도 없는 제주출신 고한수 부자의 얘기를 비중있게 다룬 건 그만큼, 일제 강점기 일본 내에서 재일 제주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산업혁명으로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1910년대 부터 적잖은 제주인들이 일본으로 일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제주인들이 값싸고 일 잘한다는 평판이 나면서, 제주와 오사카는 직행하는 여객선 군대환이 1922년 취항합니다.
1920년대 재일제주인 조명
굳이 당시 인구가 채 20만명도 안되던 제주를 연결하는 여객선을 운항했던 건,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공장에 필요한 인력이 제주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1923년 9월 고한수 부자가 겪은 관동 대지진 당시 일본으로 건너가 있던 제주인은 만명이 넘는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조선인에 대한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조선인 대학살이 이어지는 과정에 분명 적잖은 제주인들도 희생이 됐을겁니다.
이런 아픈 경험을 겪는 고한수의 성장기를 그리는 과정에 제주인들의 얘기는 반드시 필요했고, 완벽한 제주 사투리를 담아내야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드라마 '파친코' 제작진은 배역진들의 제주어 사투리 대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대본 작업때 부터 공을 들였습니다.
제주 연극인 '변종수'씨 대본 작업 참여
주연급 제주어 연기 지도
영문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한 대본에 제주 사투리를 입히기 위해 제주에서 연극배우로 활동중인 변종수씨를 선택했습니다.
변종수씨는 지난해 3월 캐나다로 출국해 대본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자가격리까지 해야 했던 시기였지만, 제작진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했습니다.
변씨는 제주어 대본 작업 뿐만 아니라, 배우 이민호와 정웅인씨의 제주어 연기 지도까지 맡았습니다.
중간중간 효과음처럼 들리는 제주사투리 가운데 변씨가 녹음한 대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제작진, "제주어 알리고 싶었다"
"제주어가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데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어서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배우 뿐만 아니라 제작자들도요.
하지만 소설 '파친코'를 쓴 이민진 작가와 감독 겸 프로듀싱을 담당한 수휴가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알리고 싶다며 제주어를 꼭 넣어야한다고 해서 제주어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변씨가 SNS에 올린 '파친코' 제주어 제작 과정의 뒷 얘깁니다.
제주 사투리는 다른 드라마에선 어미만 살짝 바꾸거나 감탄사만 넣어 어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파친코'는 현재 제주 토박이들이 사용하는 말투 그대로를 사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어 대사를 하는 배우들이 연습하면 다 할 수 있다며, 쉽지 않은 제주 사투리의 억양과 어투를 수 없이 반복해 완성도를 높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파친코'가 생생한 제주어를 그대로 담아내면서 일제 강점기 재일 제주인들의 한 맺힌 삶과 차별을 딪고 성장하는 후손들의 얘기가 더 진솔하게 와 닿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