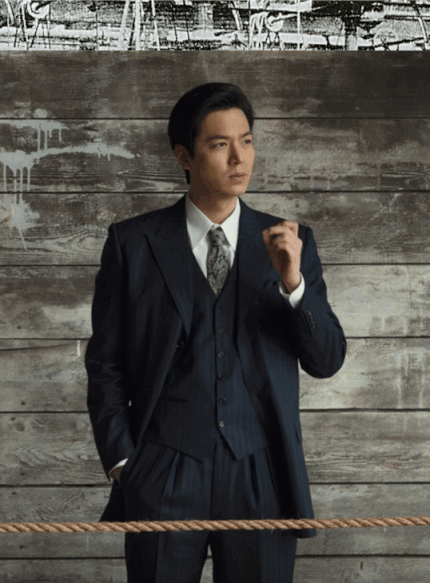
파친코 공개 영상 캡쳐, 기시와다 방적, 1930년 일본 방직공장(津市 홈페이지), 재일조선인 여성직업인 대회, 셋쓰 방직 공장 여공(제주 여성사 2) © JIBS 제주방송
[드라마「파친코」'제주의 아픔 담아냈다']
①생계 위해 떠난 아픈 여정
②제주인이 만든 기적 '이쿠노구'
③세상을 바꿔 낸 '오사카 송금'
④70여년 만에 다시 밟은 '고향 제주'
⑤생생한 '제주 사투리' 이래서 넣었다.
⑥일제에 맞서 지켜 낸 '민족혼·정체성'
⑦기억만으로 전해지는 '아픈 역사'
왜 1989년이 배경?
드마라 '파친코는 일제강점기와 1989년을 오가며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두 시기 모두 일본 경제가 정말 잘 나갔던 시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900년대 초 일본은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하면서 주변국에 영향력을 뻗쳤고, 결국 태평양 전쟁이라는 제국주의 노선을 걸었습니다.
1980년대 초부터 1989년까지 일본은 이른바 거품경제, 버블경제 속에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어갑니다.
막대한 자금력으로 전 세계 부동산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미쯔비시가 미국의 심장 록펠러센터를 인수한 것도 1989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했고, 버블경제는 1990년 거품처럼 꺼지면서 지금까지 장기간 경기침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치,경제,문화적 영향력마저 급격히 추락하면서, 일본이 선진국 대열에서 제외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드라마 '파친코'가 굳이 1989년을 큰 축에 두고 있는건, 일본의 막강한 경제력과 차별의 시선에서 꺽이지 않았던 재일 조선인, 재일 제주인들의 민족혼을 내면 깊숙히 담아내려 했기 때문은 아닐까.
꺽이지 않은 민족 정체성 자주 등장
1989년 일본 투자회사로 스카우트돼 미국에서 돌아온 여주인공 선자의 손자 '솔로몬'은 호텔 부지에 남은 재일 한국인 땅을 매입하라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1955년 4만원에 산 땅을 10억원에 사겠다며 땅주인 할머니에게 제안하지만 거절당합니다.
할머니 선자까지 동행해 도움을 청하자 땅주인 할머니는 땅을 내놓기로 합니다.
하지만 토지 매매 계약 싸인 직전 과거를 회상하며 솔로몬에게 속 얘기를 꺼내 놓습니다.
일본 치쿠호 광산에서 일했던 자신의 아버지가 차별과 천대에 항의하고 파업까지 하며 지켜낸 땅이라며, 몸안의 한 맺힌 피가, 핏방울 하나하나가 싸인을 하지 못하게 한다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묻습니다.
솔로몬은 뭔가에 두드려 맞은 듯 충격 속에 할머니 선자의 한 맺힌 삶이 순간적으로 스쳐가고 땅을 팔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곤 회사를 뛰쳐 나가며, 일본 버블경제의 상징처럼 메고 있던 '에르메스 넥타이'를 풀어 던지고 자신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되찾아 갑니다.
드라마 '파친코'에선 민족혼과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친 재일 한국인들의 얘기가 곳곳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건너간 제주인들이 일본인들의 차별과 천대를 마냥 받아들이며 버텨낸 건 절대 아닙니다.
오사카 이주 제주여성, 방직공 대다수
일자리를 찾아 일본에 간 제주여성 가운데 상당수가 오사카 인근 여러 방직공장에 취업했습니다.
일본인만으로 일손이 달리자, '말 잘 듣고 부지런한' 인력이 필요해졌고, 제주 여성들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주와 오사카 직항 여객선까지 운항됐습니다.
1934년 재일 제주인 4만 9천여명 가운데 여성이 2만2백여명이었고, 여성 방직공이 5400명 가량이나 됐습니다.
일본으로 밀항이 심해지자, 타시도는 일본 입국을 제한했지만, 제주만 오사카 방직 회사들의 요청으로 입국이 계속 허용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 방직 회사에 취업한 제주 여성 상당수는 12살에서 14살의 어린 나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제주 방직여공들은 2교대 12시간 노동을 견뎌야 했고, 휴식 시간은 고작 30분 뿐이었습니다.
월급은 20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절반 이상을 고향으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도 식사나 숙소는 열악했습니다.
공동 기숙사는 비위생적이라 전염병까지 자주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현장 감독의 잦은 폭력에 시달리기까지 했습니다.
재일 제주인, 일본 부당 대우 집단 대응 이어져
결국 1930년 오사카 인근 기시다와 방적공장에서 부당한 임금 삭감에 항의하며 방직 여공들이 파업에 들어갑니다.
일본인 노동자들의 참여까지 끌어냈습니다.
1931년엔 오사카 이쿠노구의 마쓰모토 고무공장에서 일하던 재일 제주인 여성들이 경영진과 몸싸움까지 벌이며 쟁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932년엔 오사카 연사 공장에서 부당해고에 항의하며, 제주출신 안평화를 중심으로 연사 기계 54대의 실을 끊고 파업에 들어갔다는 증언과 기록도 있습니다.
재일 한국인과 재일 제주인들의 피눈물은 오사카, 나아가 일본 경제를 지탱하며 고도 성장을 끌어낸 한 축이 됐지만, 결국 꺽이지 않았던 민족 정체성이 일본의 야욕을 무너뜨리는 큰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드라마 '파친코'가 담아내려던 제주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게 아니었을까.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①생계 위해 떠난 아픈 여정
②제주인이 만든 기적 '이쿠노구'
③세상을 바꿔 낸 '오사카 송금'
④70여년 만에 다시 밟은 '고향 제주'
⑤생생한 '제주 사투리' 이래서 넣었다.
⑥일제에 맞서 지켜 낸 '민족혼·정체성'
⑦기억만으로 전해지는 '아픈 역사'
왜 1989년이 배경?
드마라 '파친코는 일제강점기와 1989년을 오가며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두 시기 모두 일본 경제가 정말 잘 나갔던 시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900년대 초 일본은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하면서 주변국에 영향력을 뻗쳤고, 결국 태평양 전쟁이라는 제국주의 노선을 걸었습니다.
1980년대 초부터 1989년까지 일본은 이른바 거품경제, 버블경제 속에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어갑니다.
막대한 자금력으로 전 세계 부동산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미쯔비시가 미국의 심장 록펠러센터를 인수한 것도 1989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했고, 버블경제는 1990년 거품처럼 꺼지면서 지금까지 장기간 경기침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치,경제,문화적 영향력마저 급격히 추락하면서, 일본이 선진국 대열에서 제외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드라마 '파친코'가 굳이 1989년을 큰 축에 두고 있는건, 일본의 막강한 경제력과 차별의 시선에서 꺽이지 않았던 재일 조선인, 재일 제주인들의 민족혼을 내면 깊숙히 담아내려 했기 때문은 아닐까.
꺽이지 않은 민족 정체성 자주 등장
1989년 일본 투자회사로 스카우트돼 미국에서 돌아온 여주인공 선자의 손자 '솔로몬'은 호텔 부지에 남은 재일 한국인 땅을 매입하라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1955년 4만원에 산 땅을 10억원에 사겠다며 땅주인 할머니에게 제안하지만 거절당합니다.
할머니 선자까지 동행해 도움을 청하자 땅주인 할머니는 땅을 내놓기로 합니다.
하지만 토지 매매 계약 싸인 직전 과거를 회상하며 솔로몬에게 속 얘기를 꺼내 놓습니다.
일본 치쿠호 광산에서 일했던 자신의 아버지가 차별과 천대에 항의하고 파업까지 하며 지켜낸 땅이라며, 몸안의 한 맺힌 피가, 핏방울 하나하나가 싸인을 하지 못하게 한다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묻습니다.
솔로몬은 뭔가에 두드려 맞은 듯 충격 속에 할머니 선자의 한 맺힌 삶이 순간적으로 스쳐가고 땅을 팔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곤 회사를 뛰쳐 나가며, 일본 버블경제의 상징처럼 메고 있던 '에르메스 넥타이'를 풀어 던지고 자신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되찾아 갑니다.
드라마 '파친코'에선 민족혼과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친 재일 한국인들의 얘기가 곳곳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건너간 제주인들이 일본인들의 차별과 천대를 마냥 받아들이며 버텨낸 건 절대 아닙니다.
오사카 이주 제주여성, 방직공 대다수
일자리를 찾아 일본에 간 제주여성 가운데 상당수가 오사카 인근 여러 방직공장에 취업했습니다.
일본인만으로 일손이 달리자, '말 잘 듣고 부지런한' 인력이 필요해졌고, 제주 여성들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주와 오사카 직항 여객선까지 운항됐습니다.
1934년 재일 제주인 4만 9천여명 가운데 여성이 2만2백여명이었고, 여성 방직공이 5400명 가량이나 됐습니다.
일본으로 밀항이 심해지자, 타시도는 일본 입국을 제한했지만, 제주만 오사카 방직 회사들의 요청으로 입국이 계속 허용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 방직 회사에 취업한 제주 여성 상당수는 12살에서 14살의 어린 나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제주 방직여공들은 2교대 12시간 노동을 견뎌야 했고, 휴식 시간은 고작 30분 뿐이었습니다.
월급은 20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절반 이상을 고향으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도 식사나 숙소는 열악했습니다.
공동 기숙사는 비위생적이라 전염병까지 자주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현장 감독의 잦은 폭력에 시달리기까지 했습니다.
재일 제주인, 일본 부당 대우 집단 대응 이어져
결국 1930년 오사카 인근 기시다와 방적공장에서 부당한 임금 삭감에 항의하며 방직 여공들이 파업에 들어갑니다.
일본인 노동자들의 참여까지 끌어냈습니다.
1931년엔 오사카 이쿠노구의 마쓰모토 고무공장에서 일하던 재일 제주인 여성들이 경영진과 몸싸움까지 벌이며 쟁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932년엔 오사카 연사 공장에서 부당해고에 항의하며, 제주출신 안평화를 중심으로 연사 기계 54대의 실을 끊고 파업에 들어갔다는 증언과 기록도 있습니다.
재일 한국인과 재일 제주인들의 피눈물은 오사카, 나아가 일본 경제를 지탱하며 고도 성장을 끌어낸 한 축이 됐지만, 결국 꺽이지 않았던 민족 정체성이 일본의 야욕을 무너뜨리는 큰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드라마 '파친코'가 담아내려던 제주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게 아니었을까.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